‘까짓것 고사성어’, 매주 월요일이면 본지에 꼬박꼬박 연재 중인 작은 코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한자라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여기다 한술 더 뜬 고사성어는 더욱 다가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까짓것 고사성어’는 이렇듯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고사성어와 한자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소개하는 코너다.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고사성어의 쓰임새를 알아보고 그 고사성어의 정확한 유래와 출처를 중국 역사를 통해 함께 알려주고 있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이 고사성어 연재를 하고 있는 주인공 이정찬(46세, 동천동) 씨다. 중국 전문가인 이 씨와 지난 금요일 한 카페에서 만났다.

애초 이 씨는 대학 시절 경북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졸업 후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영남대 국사학과에 다시 편입했다. 이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특히 동북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북경중앙민족대학으로 유학까지 가게 됐다. 공부를 오래 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도 많은 셈이다.
“원래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편입도 했고 중국으로 가서도 좀 더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데 역사 자체에 관한 관심도 있었지만, 역사와 문화의 근원에 대해 고민이 더 많았다. 중국의 문화적 다양성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연구하고자 마음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소수민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그는 북경중앙민족대학에서 정식으로 중국 소수민족을 공부하는 민족학을 전공했다. 우리로 치자면 문화인류학과 비슷하다고 한다.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이곳에서 받았다. 이렇게 8년간의 긴 타지 공부를 마치고 2013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11살, 6살 두 아이를 키우는 네 식구의 가장이기도 한 이 씨는 이미 강북지역에 11년째 살고 있는 동네 주민이다. 다만 중국으로 가기 직전 이사를 와서는 수년을 비운 것이다. 그 사이 중국과 국내를 오가기만 하다가 이제야 최근 몇 년째 제대로 된 지역 주민으로 살고 있다.
현재 이 씨는 대구에서 활동 중인 ‘인문사회연구소’ 전문위원,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학술 및 대외협력 국장을 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장 애쓰고 있는 활동은 바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두어 달 전부터 마을 주민들과 중국어도 공부하고 중국 여행도 가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평소에는 정기적으로 만나 중국어와 중국에 관해 공부하고 6월경에는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 단체 중국 여행을 갈 계획이다.”
여행사를 통해 가는 중국여행과 다르게 중국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체험 중심의 여행이 될 것이라고 한다. 참가자도 추가로 별도 모집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을에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나누는 여러 가지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중국어와 중국 여행은 물론 한자 교육, 어린이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마을에서 중국을 콘텐츠로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듯싶었다. 이른바 마을과 세계의 만남이랄까.
그런데 정작 이 씨는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을 고민해봤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전했다.
“일의대수(一衣帶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까운 지척 사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 진정한 이웃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중국을 대하는 입장이 아직 아쉽다.”
최근의 한중FTA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중국 쪽의 소식들을 보면 이를 통해 한국의 좋은 것을 좀 더 쉽게 들여올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많은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중국의 문제점들을 다루는 시각이 많다고 한다.
서로의 차이는 결국 문화적인 차이일 뿐인데 너무 경제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중국의 강점은 문화적 수용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다양한 민족이 만든 현재의 중국문화가 이를 보여준다. 지금 중국에서 인기 높은 한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런 모습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꿈을 묻는 말에 강북지역에서 중국문화연구소를 만들고 싶다고 답한 이 씨는 이를 통해 중국과 연계한 교육, 문화 사업에 힘쓰고 싶다고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은 강북지역의 특징을 살린다면 마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전했다.
중국의 문화적 수용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마무리하려니 처음에는 마을과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그의 구상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졌다. 마을 또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와 재능들이 서로 어우러져 그 마을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런 이야기와 콘텐츠가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지고 섞이느냐에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가 될 앞으로의 그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강북신문 김지형 기자
earthw@naver.com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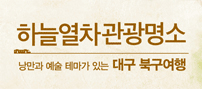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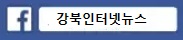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