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세요~
함께 사는 세상이요
조선 후기 유재건(劉在建)이라는 선비가 지은 인물 행적기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승을 하직하고 옥황상제 앞에 서게 된 세 사람이 있었다. 상제는 각자의 살아생전 행적을 살핀 뒤, 이를 어여삐 여겨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각자의 소원대로 이를 들어주기로 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좋은 집에 태어나 장원급제해 높은 벼슬에 올라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상제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다음 사람은 “저는 부자가 되어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상제는 그 소원도 받아들였다.
마지막 사람이 머뭇거리며 소원을 말했다. “저의 소원은 앞 두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조용히 한가로이 지내기를 좋아하고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아, 그저 눈비나 피할 초가집에 살면서 몇 마지기 농사로, 아침에 밥먹고 저녁에 죽먹고 배 채우면 그만입니다. 여름에 베옷입고 겨울에 솜옷 입을 수 있다면, 옷이야 그저 성하고 깨끗하면 됩니다. 집안에 복잡한 일 없고 집밖에 시끄러운 일 없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유유자적하며 걱정없이 오래 살다가 한 세상 고이 마무리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상제는 탄식하며 말했다.
“네 소원이 청복(淸福)인데, 청복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하늘이 몹시 아껴 잘 내려주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다 얻을 수 있다면 너만 차지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내가 먼저 차지하지, 뭐 하러 골 아프게 옥황상제 노릇 하리오.”
누구나 잘 살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의 숱한 얘기들이 있고, 또 우리네 삶에서도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 또한 천차만별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저 행복이라 함은 일단 생존의 문제인 의식주의 기본은 해결돼야 하리라. 또 남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리라. 아무리 호의호식 하더라도 내 옆에 아무도 없다거나, 있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거나,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거나. 심지어 나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거나(인터넷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겪는 터무니없는 악플의 폭력, 어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결코 행복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다가 ‘행복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이왕이면 남보다 잘났으면 좋겠고, 남을 부리면 더 좋고, 한마디로 돈도 많고, 멋진 집에,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온 가족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세상 온갖 재미난 일도 해보고, 맛있다는 것도 먹어 보고, 이왕이면 날마다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부귀영화, 입신양명 등등 셀 수도 없이 많은 걸 얻고 이뤄야 행복할 것 같다. 아니 욕망의 끝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가. 죽을 때까지,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다투고, 죽어라 악을 쓰고 등등, 등등.
살맛 나는 게 행복이지
행복 추구 자체야 뭐 시비할 게 있겠나. 다만 지나친 욕심이 문제 아닌가. ‘적당한(사실 이 적당함을 두고 생각들이 나뉘는 것이지만)’ 행복추구는 바로 생명추구가 아닌가 한다. 살맛나는 게 행복이지.
사람들은 “진정 아름다운 행복, 파랑새는 저 하늘 저 산 너머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더라도, 나에게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꼭 좋은 옷입고 맛있는 것 먹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미소, 좋은 친구들, 즐거운 대화 등등 소소한 일상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었다는 게다. 다만 어리석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뿐. 그래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들 한다.
사실 외부조건과 내면적 마음먹기 이 둘 사이 어떤 곳에 각자의 행복은 숨어 있으리라.
열복(熱福)과 청복(淸福)
다산(茶山) 정약용은 병조판서 오대익의 71세 생일을 축하하는 글에서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했다 한다.
하나는 뜨거울 열(熱)자의 열복(熱福)이고, 다른 하나는 맑을 청(淸)자의 청복(淸福)인데, 열복이 몸을 달게 하는 화끈한 행복, 세속적 조건적 행복이라면, 청복은 남보기에는 사소하지만 맑고 청아한 삶의 일상, 내면 의미와 연관된 행복을 말하는 것 같다.
둘이 칼로 자르듯 분리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분은 가능하리라. 열복도 결국 내 마음이 흡족해야 하는 일이라면, 청복도 의식주는 해결해야 하는 일인지라, 지나치게 별개로 생각한다면 몸과 맘이 따로 놀 우려가 있다. 열복도 청복도 다 우리의 복이다.
그래서 청복은 청빈(淸貧)과는 조금 다르다. 청빈이 자발적 가난을 말한다면 청복은 소박한 현실적 행복이랄까. 그래서 청복은 굳이 가난할 필요까지는 없다.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부자이기는 어렵겠지만 말이다.
이건 보통사람들도
청빈 즉 자발적 가난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물질적 소유욕에서 해방된 자유를 뜻한다면 일반적으로 성직자나 구도자에게 해당한다. 그러나 부(富)가 많고 적음에서 초연한 청복은 우리 보통사람도 추구 가능하다. 부자도 청복할 수 있고(경주 최부자가 그런 예일런가), 가난한 자도 청복할 수 있다. 부자도 열복에만 시달릴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열복에만 허우적거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삶에는 분명 ‘청복’이라 이름할 그 어떤 모습이 있다. 아니, 있어야 할지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청복을 많이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들은 대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행복인 경우가 많다. 고급 아파트에 멋진 자동차, 넉넉한 은행잔고, 명품 가방들고 호텔을 드나든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친 행복이지, 진정 내가 선택한 행복은 아니다.
‘좋은 대학, 대기업 들어가면 행복해진다’ ‘높은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등등은 모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행복이다. 반드시 얻으리라며 내가 결단한 행복 같지만, 곰곰 따지고 보면 현 세상이 세뇌시킨 행복이다.
‘주입된 행복’이라고 이를 전면 부정하자는 건 아니다. 어차피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 삶은 세상적 삶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 나만의 삶도 있는 것이다. 그걸 추구하는 게 청복으로 가는 길이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코로나 사태가 식을 줄 모른다. 올 한 해도 먹거리를 추수하게 해주신 하늘과 조상에 감사하고 이웃친지들이 서로를 격려한다는 추석도 ‘언컨택’이라는 이상한 추석으로 허겁지겁 보낸 세상이다. 세계 최강국이자 최부국이라는 미국이, 국가 리더십의 핵심인 백악관이 코로나 19의 온상이 되고, 대통령 부부와 참모들이 확진판정을 받는 세상이니, 열복도 열이 너무 났나 보다.
청아한 가을 청복도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긴 하다. 하지만 삶이란 게 가끔씩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우리 삶이 ‘소리에 놀라고, 그물에 걸리고, 진탕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말이다.
전인철 편집주간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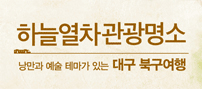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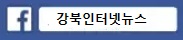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강북신문인터넷뉴스(주)인터넷신문등록 대구 아 00126등록일자 2013년 12월 18일발행인 김재우/편집인 김영욱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