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마당
사는 게 조금 시들하게 여겨지는 나날들에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시를 발견하면 삶이 강렬하게 느껴진다. 소풍을 가기 전날처럼 설레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처음으로 그렇게 다가온 시가 윤동주의 <서시>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시>를 처음 읽던 순간 마음이 한껏 맑아졌다. 시를 읽으면서 마치 순결한 영혼에 감전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삶을 그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부터 비로소 좋은 시를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맘에 쏙 드는 시를 만날 때마다 마치 별천지에 온 것 같았다. 특히 천상병의 <귀천>을 읽고 나서는 뭔가에 홀린 듯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마냥 앉아 있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1996년 5월 천상병의 <귀천>을 읽다가 멈칫했다. 죽는 일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죽음을 이토록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다. 시인의 말은 내게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라는 소리처럼 들렸다. 시를 읽고 나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의 말줄임표를 멋진 삶으로 채워 넣고 싶어졌다.
2011년 8월에는 도종환의 시 <라일락 꽃>이 일상을 밋밋하게 혹은 따분하게 이어가던 내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었다.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빗물에 연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 도종환, <라일락 꽃>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온갖 어려움을 당하여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 가끔은 여태껏 살아온 모습을 벗어나서 다른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랄 때도 있다. 그런 순간에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는 시인의 말은 적잖은 위로가 된다. 못나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다독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지금껏 살아온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2009년 4월 도종환 시인이 온종일 비가 내리는 날에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디서 달콤한 향기가 번져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골목 끝에 라일락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시인은 라일락 꽃 옆을 서성이다가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라는 꽃의 말을 들었다. 라일락 꽃은 여린 연보라색이라 비에 젖으면 금방 지워질 것 같은데도 제 빛깔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도종환은 내일 또 비에 젖어도, 내년에 다시 비에 젖어도 제 빛깔 제 향기를 잃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일락 꽃>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성선의 <사랑하는 별 하나>를 처음 감상했던 2007년 4월 어느 날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하나 더 늘어났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쳐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화안히 안기어
눈물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 이성선, <사랑하는 별 하나>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물음이 아니라 소망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따스함을 안겨주는 사람, 누군가 외로울 때 다정한 눈빛을 건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자신을 되찾고 싶은 것이다.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는 것이다. 환한 웃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 은은한 향기와 빛깔로 다른 이를 물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오래전에 다짐했던 기억이 떠올라 다시 가슴이 설레는 것이다.
2009년 12월 29일에 열린 울산사랑 시노래회 콘서트에서 정호승 시인은 도종환의 시 <벗 하나 있었으면>을 낭송하였다.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리메처럼 어두워올 때 /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에 도종환 시인은 정호승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낭독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갖고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때때로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꼭 껴안아 주는 것이다.
스스로를 낮추어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에겐 편히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다.
그늘에 앉아 바라보면 삶의 햇살이 더욱 아름답게 반짝인다.
눈물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아픔이나 슬픔으로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때때로 외롭고 쓸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다독거려 주는 것이다.
스스로 슬픔이 무르익어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에겐 편히 기대고 싶은 구석이 있다.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2014년쯤에 읽은 박노해의 <굽이 돌아가는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내게 새로운 길을 선사하였다. 멋있고 정답고 아름다운 길, 멀고 쓰라릴지라도 더 깊어지고 환해지는 길을…….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어진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곧은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 박노해, <굽이 돌아가는 길>
휘어 자란 소나무가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 더 멋있는 이유는 부드러움과 여유로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는 혼자서 바삐 흘러가지만 휘청 굽어진 강줄기는 주위 풍경을 푸근하게 감싸며 흘러간다.
일직선으로 뚫린 길에서는 제 모습대로 곱게 피어 있는 꽃들을 보기가 어렵지만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에서는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지닌 꽃들을 마음껏 볼 수 있다.
곧은 길 끊어져 길이 없어도 없던 곳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생기는 것이 바로 길이다. 주저앉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삶은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걷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앞이 어두컴컴해도 견디고 버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굽이 돌아가는 길은 곧은 길보다 멀고 빛나는 길보다 쓰라리다. 그러나 흘린 땀방울만큼 삶이 깊어지고 환해지는 길이다.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길이 되는 것이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서시>, <귀천>, <라일락 꽃>, <사랑하는 별 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굽이 돌아가는 길> 등 내 마음을 사로잡은 시들은 인생의 굽이굽이에서 넉넉한 위로가 되었다. 그윽한 향기로 영혼을 물들였다.
여태껏 나에게 시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었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었다. 비에 젖지 않는 꽃의 향기이며 비에 지워지지 않는 꽃의 빛깔이었다. 외로울 때 다가오는 별이었고 쓸쓸할 때 웃어주는 꽃이었다.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었고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이었다. 길을 걷다가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런 말도 없이 뻗쳐오는 손길이었다.
지인호 사회문화평론가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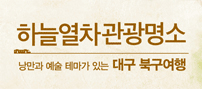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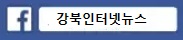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강북신문인터넷뉴스(주)인터넷신문등록 대구 아 00126등록일자 2013년 12월 18일발행인 김재우/편집인 김영욱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