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세요
함게사는 세상이요~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2020년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했습니다. 사람살이라는 게 의례 다사다난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자년 올해는 코로나 역병으로 더욱 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아직 이 환난의 끝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당장 눈앞에서는 하루하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하다고 자부해왔는데, 오랜 대응에 지쳐 자칫 방심한 탓이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예년에는 연말이면 새해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소 칙칙한 분위기임을 감추긴 어렵군요.
그런데 잠깐. ‘생존의 위협이라는 코로나 맹위에 억눌려 내가 세상을 너무 어둡게만 보는 건 아닐까. 아무려나 그래도 좋은 일도 있었겠지.’ 그래서 곰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올 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큰 상을 받았고, 한류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며, 손흥민의 골 소식에 마치 내 일처럼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 각자 개인적으로는 크고 작은 ‘소확행’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계대전 중에도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난관을 헤쳐 나갔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용기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은 넉넉하다는 믿음을 애써 일궈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선한 의지들은 느리지만 결코 멈추진 않는다는 믿음 말입니다. 내년 봄이면 모든 게 나아질 껍니다.
그래도 인간은 희망의 존재
사실 시간은 많은 것을 퇴색시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낡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의 거대한 위세 앞에 마냥 굴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보낼 것은 고이 보내드리고, 새로운 기대로 미래를 맞이합니다. 이걸 일러 희망이라 부릅니다.
희망을 위해서는 시간 앞에 잠시 멈춰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저편으로 보내야 할 것들과 그래도 붙들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들을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의 거센 흐름에 휩쓸리기만 해서는 이를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단 연말만이 아니라, 생일이나, 입학식 날, 이사간 날 등 그 어떤 날이라도 시간 앞에 멈춰 설 계기만 되면, 이를 새 삶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보낼 것은 고이 보내드리고, 기억 한 편에 잘 갈무리 할 것은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앞날의 인생항로에 나침반이 될 것은 잘 닦아서 다시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시간으로 삶이 퇴색되는 것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비록 시간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결코 시간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올해는 비록 역병의 삭막함으로 그다지 훈훈한 세모는 아니더라도, 지난 삶들을 반추하며 저무는 해를 고이 보내드리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속절없이 낡아가는 것은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름다운 까닭일 것입니다. 김종길 시인은 ‘설날 아침에’ 노래합니다. 전문을 꼭 찾아 한 번 쯤 낭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 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중략)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마음도 영양이 필요하다
사실 이상이면 오늘 이 글에서 필자가 하고픈 이야기를 다 한 셈인데, 괜한 노파심에 희망과 용기를 두고 덧글 몇 마디 더 붙여보려 합니다. 김종길 님의 시에 젖은 마음이라면 더 이상 이하 글은 읽지 않아도 무방하리라 싶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듯, 가진자나 못가진자 높은자나 낮은자, 잘난자나 못난자 가릴 것없이 먹어야 삽니다. 생명은 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이를 과학으로 말하면 생명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얻은 에너지로 신진대사를 해야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생명의 숙명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집니다. 태양빛과 공기를 밑천으로 광합성을 해 에너지를 얻어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생명은 여타 생명들과 좀 다릅니다.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밥은 필수이되, 사람은 마음도 편해야 삽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몸건강은 몸의 밥(몸밥)이 챙겨줍니다. 마음 건강은 마음의 밥(맘밥)이 챙겨줍니다. 몸밥은 평소 우리가 먹는 밥을 말하는 걸 알겠는데, 맘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사랑, 의미, 보람, 행복감, 희망, 인정받기 등등, 소위 긍정적 마음을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들일 것입니다.(이는 다음 기회에 상술하려 합니다.)
편식은 건강에 해로워
사람은 남녀노소 없이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의미나 보람도 느껴야 하고, 아~ 나도 잘 살고 있어라는 행복감도 느껴야 하고, 그래!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라는 삶의 의지도 불쑥 불쑥 솟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물론 몸밥도 꼭 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모든 것, 즉 의식주 모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몸밥과 맘밥은 완전 별개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예를 들어 좋은 옷, 좋은 집을 갖게 되면 마음도 좋아지고, 반대로 인간승리 감동드라마를 보고는 당장 밥을 안먹어도 배가 뿌듯해지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또 더 좋은 집을 바라게 되고, 드라마의 감동은 곧 식게 마련이지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맘이나 몸 한 쪽으로 치우친 밥이 되어 밥의 영양 균형이 어긋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영양균형이 깨지면 몸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몸과 맘은 인간이라는 동전의 양면일 것입니다. 몸없이 맘없고, 맘없이 몸없다는 말입니다.
살맛나는 세상은 어디에
그런데 사실 한 개체만 아니라 한 사회에도 몸건강 맘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필자는 현재 우리사회의 몸과 맘 균형은 그다지 건강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만 돌아보면, 우리사회는 몸밥만 치중해왔지 않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전에 너무 못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허기를 채웠으면, 맘밥도 좀 신경써야 할 때가 됐는데, 배고픈 기억의 관성으로 미처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몸밥이든 맘밥이든 편식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균형잡힌 식단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건 애들도 아는 사실이지요.
사회의 마음을 우리는 문화라 부릅니다. 문화에는 제도 법 관습 전통 등 많은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한 사회의 의식, 세상인심을 규정하지요. 그런데 모든 문화는 그 고유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 모양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문화의 모양 가운데는 사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모양도 있고, 안되는 모양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도움이 됐는데, 오늘은 안되는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코로나에 서양사람들은 초기에 한사코 마스크를 거부했습니다. 그네들 안목으로는 그게 맘에 안들었기 때문이지요. 문화라는 게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많이 규정합니다.
몸밥이 모자라 배가 고픈 걸 불행이라 합니다. 맘밥이 모자라 허망해지는 걸 불안이라 합니다. 우리사회는 예전보다 불행은 많이 가셨으나, 불안은 더 깊어갑니다. 굶어죽는 사람은 없으나 상대적 박탈감에 스스로를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더 늘어났지요.
몸밥이 입에 맞는 것을 우리말로 맛있다 그럽니다. 맘밥이 마음에 드는 것을 같은 멋있다 그러지요. 우리 조상들은 맛과 멋이 둘이 아님을 일찍이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맛있는 밥 많이 드시고 멋있는 우리가 되는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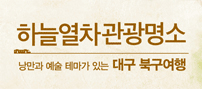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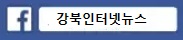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강북신문인터넷뉴스(주)인터넷신문등록 대구 아 00126등록일자 2013년 12월 18일발행인 김재우/편집인 김영욱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