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이편 1-3) 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 빤지르르 하게 잘 하고 표정을 꾸미는 사람치고 인한 이가 드물다.”
교언영색(巧言令色). 우리 전통 사회에서 두고두고 경멸 혐오하던 캐릭터다. 말을 교묘하게 돌려치고 메치면서 사람을 기만 현혹시키는 일. 얼굴에 온갖 아부 아첨하는 표정을 지으며 사람을 홀리는 일. 위선을 떠는 일. 겉 다르고 속 다른 일. 그래서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돌리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참 나쁜 이기주의자. 제 밖에 모르는 얌체. 이런 여우에게 속느니 차라리 늑대에게 한 대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모르고 당하면 더 약오른다. 다음에 또 당할 수도 있으니 더 찜찜하다.
공자도 이런 캐릭터를 극혐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둘로 나눠볼 수 있다. 악행을 악행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자와 알고도 저지르는 자. 전자는 개과천선이라도 할 수 있지만, 속으로 온갖 계산을 하는 후자는 고칠 길이 막막하다. 그리고 알고도 저지르는 악행이 부정적 파급효과도 더 넓고 깊다. 한밤중 뒷골목에서 뒷통수 치는 일이 백주대낮 면전에서 대거리하는 일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게다가 교언영색은 잘 분간이 되질 않는다. 당하는 이는 그게 좋은 것인 줄 속아 치즈 바른 쥐약을 덥썩 무는 꼴이다. 세상에 불신과 의심을 무한 퍼뜨린다. 암적 존재다. 극심한 통증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당한지 아닌지도 잘 모를 일이다. 과실치사 살인범과 수 만 명에게 손해를 입힌 경제사범 중 누구 죄질이 더 사악한지는 금방 판단이 서질 않는다.
교언영색하는 세상
논어에는 ‘교언영색’을 경계하는 구문이 둘 더 나온다. 말년의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며 교언영색을 부단히 경계했기에 스승 사후에도 그 말씀이 귀에 쟁쟁했나 보다. 양화편 17에는 학이편과 똑같은 글이 나오고, 공야장 24에서는 좀 더 부언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교언영색하며 공손함이 지나친 행실을 옛날 좌구명(左丘明. 공자 이전에 실존했던 어떤 현자. 춘추좌씨전의 저자 좌구명과는 다른 전설상 인물.)이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또한 이를 부끄러워 한다. 좌구명은 미움을 감추고 그 사람과 사귐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 또한 이를 부끄러워 하는 것이다. (子曰,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 공야장 24)) 학이편의 ‘교언영색’이 타자의 교언영색을 경계하는 말이라면, 공야장의 교언영색은 나 스스로도 이같이 부끄러운 일인 교언영색을 결코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말이다. 타자든 나 스스로든 교언영색은 인(仁)하고 거리가 한참 멀기 때문이다. 싫은 사람, 손절해야 할 사람을 그 사람의 사회적 조건이나 배경 때문에 마지 못해 사귀는 것, 그이에게 교언영색 하는 것, 이것은 참다운 사람이라면 결코 할 짓이 못된다. 유가는 호오를 가리지 않는, 인맥을 넓히기만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권하지 않는다. 그건 위선이고 자기기만이다. 인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인한 사람만이 남을 미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인(仁)은 사람다움
공자사상의 핵심인 인(仁)은 한마디로 개념정리하기 어려운 말이다. 사람이 그렇고 삶이 그렇기 때문이다. 복합적 다층적 다원적 존재인 사람(삶)의 가장 최종 가치인 인을 인간 언어로 완벽 규정하긴 어려운 법이다. 구체적 정황을 예시하며 설명하는 수 밖에 없다. 또 논어에는 인을 바로 적시하기보다는 인 아닌 것에 빗대어 인을 설명하는 일도 자주 나온다. 달을 그리기 어려우면 달을 가린 구름을 그려 달이 스스로 드러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이편 교언영색 구문에서도 인을 이렇게 그려낸다. 교언영색하면 인이 아니다. 교언영색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인에서 그만큼 멀다. 교언영색 하면 사람꼴도 부끄럽게 되지만, 세상도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찬다. 사람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만 봐도 이는 선명하다. 온갖 가짜 뉴스가 그럴듯한 말 본새로 치장하고 세상을 기만한다. 그러면서 계급 이익, 진영 이기를 극대화한다. 이를 부끄러이 여기지도 않는다. 세 치 혀로 세상을 현혹시키는 자들의 궤변과 극언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 아내의 미소와 꽃뱀의 아양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 오히려 그 궤변과 아양이 더 먹히는 세상. 그런 인성이 각광받는 세상. 그런 인성을 낳은 뒤틀어진 사회구조. 이를 분별하는 안목과 지혜조차 무시당하는 세상. 어둠이 빛을 가리는 꽉 막힌 세상. 밥이 더 깊어야 새벽이 온다고 자위하며 공분을 삭혀야 하는 세상.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다. 공자는 인이라는 가치를 다시 세워서 이 어둠을 타개하자고 외친 사람이다.
사람의 향기로
인(仁)은 꼭 도덕적 덕목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성의 가장 깊은 덕성이라 보는 게 맞다. 그럴듯한 말과 꾸민 외양은 상대나 세상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악의에서 나오는 언행이다. 인간 본심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교언영색은 그걸 구사하는 자의 덕성마저 망가뜨린다.
공자의 인은 윤리적 범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은 윤리적 덕목을 포괄하는 감성적 인성이다. 그렇다고 인이 단순히 착하고 다정하고 온정적인 감성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다. 인은 심미적 인품, 미학적 사람향기까지 나아가는 가치다. 그래서 인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도덕적 요청 정도는 훌쩍 넘어선다. 그래서 공자는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근거한 법치보다는 사람향기로 사람마음을 움직이는 덕치를 내세우는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일까. 인간을 너무 좋게 본 것일까. 살면서 흔히 맞닥뜨리는 인간의 이기와 공격성은 매우 강력한 생존 에너지다. 이를 도외시하고는 사람과 세상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 맞다. 그렇지만 그 힘만으로는 세상을 뿌리부터 치료할 수 없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만 잘라내서는 건강한 나무를 가꿀 수 없다. 그래서 덕치는 근치(根治)다. 근치를 해야 생명이 촉촉이 젖는다. 아무리 그 길이 멀지라도.
도덕과 정치
그래서 공자는 ‘도덕군자와 소인배’만을 말하진 않는다. 인인(仁人)을 넘어 성인(聖人)까지 나아간다. 논어는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많이 거론한다. 앞으로 많이 언급될 것이기에 오늘은 간단히만 살펴보자. 소인은 손익에 민감한 자다. 만사를 이해(利害)로만 따진다. 그래서 남과 무리짓기는 잘하지만 화합하기는 잘못한다. 붙어다니면서 싸운다. 이익이 되기에 무리는 짓지만, 그 무리 안에서 자기 이익만 쫓기에 화합에는 서툴다. 또 소인은 줏대가 없으므로 남이 얼마든지 그를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군자는 만사를 이해보다는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 선악 또는 진위(眞僞)다. 남과 조화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선악 구분에 민감하기에 무리에 휩쓸리지는 않는다. 줏대와 주인의식이 있어 남이 그를 대신하기 어렵다. 소인과 군자는 따로 있다기보다는 사람이 살다보면 소인이 되기도 하고 군자가 되기도 한다. 누구든지 그렇다. 군자나 소인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는 말이다. 원래 군자(君子)는 군주의 자식(지배계급)이라는 말인데, 공자는 이를 ‘덕을 쌓은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 누구든 덕을 쌓은 자가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인인(仁人)은 사람다운 사람이다. 소인은 사람다운 짓을 할 때가 드물고, 군자도 때로는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지만, 인인은 아주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리사욕이 없기에 살신성인(殺身成仁)하고, 참용기가 있기에 인자무적(仁者無敵)이다. 군자의 완성판이라 해도 좋겠다.
끝으로, 성인(聖人)은 사람다움의 완성이다. 널리 베풀어 모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현실에서는 없다. 요순도 아니다. 공자의 목표다. 사회를 향한 큰 실천, 공공성의 화신이다. 동양사상, 특히 유가에서는 내성외왕(內聖外王), 즉 인격적 성인이 백성을 다스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사람됨의 가장 으뜸으로 삼았다. 그래서 윤리학이 곧 정치학이다. 올바른 도리가 개인에게 적용될 땐 윤리학이고, 다수에 적용될 땐 정치학이다. 도덕과 정치가 둘이면서 하나이던 아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날 새삼 그리운 이야기다.
전인철 편집주간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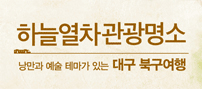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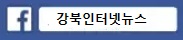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강북신문인터넷뉴스(주)인터넷신문등록 대구 아 00126등록일자 2013년 12월 18일발행인 김재우/편집인 김영욱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