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칼럼] 투표, 꼭 해야 하나요
“안하면 우리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2020년 04월 05일 (일) 12:02 입력 2020년 04월 05일 (일) 12:11 수정
함사세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한다. 어떨 땐 정치 얘기가 지겨울 때도 있겠지만 정치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니, 잠시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 특히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우리 정치발전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선거다.
그 포인트는 이렇다. 정계는 물론 언론, 재벌, 검찰의 기득권 세력들이 짜놓은 거대하고도 강고한 적폐카르텔을 어느 정도라도 무너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보수 진보 양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기존의 양상으로 주저앉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라는 거다. 더욱이 지난 연말 바뀐 선거법에 따라 선거연령이 18세로 한 살 낮아진데다, 꼼수가 난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하는 문제도 얽혀 있어, 그 귀추가 잔뜩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유권자들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 꼭 투표를 해 주권을 선명히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투표 참여 홍보광고.
민주주의 꽃이긴 한데...
말로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민주(民主), 즉 국민이 주인인 이 제도가 제대로 꽃 피려면 주인이 주인행세를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권행사가 좀 저조하다. 특히 20대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또 대선에 비해 총선 투표율이 더 낮아, 선거 이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됐느냐”는 걱정을 낳기도 하고, 당선자의 정통성을 그만큼 약화시키기도 한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도 투표율,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은 상당히 낮다. 이를 걱정해 호주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 호주 돈으로 20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1만 6천여원을 부과하는데, 투표율이 90%에 이른다니, 효과가 있는 모양이다. 물론 투표를 안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출이므로 이를 반강제적으로 저지하는 것 또한 주권침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벌금을 부과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아져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에 합의한 만큼 호주국민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투표장을 잔치마당으로
게다가 호주는 보통 토요일을 투표일로 하는데, 이날 투표소 앞에서는 이런저런 시민단체들이 ‘민주주의 소시지’라는 핫도그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커피와 함께 제공하는 등 투표일은 온동네 잔칫날같은 분위기라니 이 또한 신선하다. 우리도 투표소 앞에서 문화놀이 마당 같은 잔치를 벌이는 것도 한 번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말이다.
왜 투표를 안할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투표를 안할까. 라스웰이라는 정치학자는 정치적 무관심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정치보다는 예술, 여가, 취미, 오락 등 다른 분야에 더 몰두하는 경우, 둘째,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나 그 기대나 욕구가 좌절돼 정치혐오증이 생긴 경우, 셋째로는 종교신비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 같이 사상이나 신념이 현실정치와 반대되는 경우 등이다.
우리의 경우는 두 번째가 가장 부합하고 이에 첫 번째가 덧붙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싶다. 투표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맘에 드는 후보가 없어요. 차라리 놀러나 가겠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달픔을 제대로 짚어주는 정치인이 어디 있기는 있나요. 청년정치 좋아하시네. 뭐 이런 반응이겠다.
일견 맞는 얘기다. 근대 민주주의의 기둥을 세운 프랑스의 루소라는 이도 “시민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로운 것은 투표할 때뿐이고, 일단 대표자가 선출되고 나면 이전과 같은 노예상태가 계속된다”며 간접민주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2백 수십년 전 서양에서도 그 모양이었던가 보다.
몰아세울 일도 아닌데
암튼 상황이 이러니 무조건 투표 안한다고 몰아세울 일도 아니다. 사실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제법 뚜렷한데, 안하는 이유는 글쎄. 딱히 할 이유가 없으면 대개 안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 행태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런데 이건 분명하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나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건 필자의 말이 아니라, 근 2천 4백년 전 고대 민주주의가 시행되던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다. 어떠한가.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아니한가. 간혹 TV에 나오는 청문회 같은 걸 보면 ‘에휴’ 싶을 때가 있는 건 필자 혼자만인가. 그러니 맘에 안든다고 마냥 피하기만 한다면 더 맘에 안드는 꼴 보기 십상이다. 내 삶이 별 같잖은 자의 손에 휘둘리는 건 또 어떻고.
그러니 투표하자
그러니 투표하자. 시민의식 주인의식 이런 거 말고라도 “내가 너같은 게 설쳐대는 게 보기싫어 투표한다”는 식의 치사한(?) 발상으로라도 투표하자. “내가 투표해봤자 어차피 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 물론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문제라는 게 초등학교 산수문제 풀듯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될 때까지 이슈로 만들고 공론화하고 논쟁하고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어느 날 어, 하는 식으로 ‘도둑같이’ 이뤄지는 게 사회문제들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좀 힘이 든다. 당장의 내 한 표가 뭘 해결하겠냐 싶지만 그래도 내 한 표 없이는 싹이 트지 않는다. 그러니 큰맘 먹고 투표장에 나서자. 헛수고하는 셈치고라도 투표장에 나서자. 나보다 못한 자가 자칫 내 삶을 얼마나 훼손할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청소년 모의선거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주인의식을 제대로 함양할 시민정치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그렇고 공교육에서도 그렇다. 어린 자식이 이제 세상에 나가 살 정도로 성장하면 아버지가 이런저런 세상살이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과 같다. 주인노릇 할려면 뭘 챙겨야 하는지, 조곤조곤 얘기하는 아버지의 심정 말이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 정치선진국들에서는 청소년 모의선거, 스튜던트 보트 등이 활발하다. 교육결과도 고무적이라 한다. 청소년들에게 정치물이 들게 한다는 궤변으로 막을 일이 아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정국 속에서 치러진다. 마스크 하고 줄서기도 왠지 그렇지만, 내가 한 표를 잘 행사해야 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난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재차 새겨보자.
전인철 편집주간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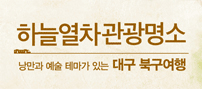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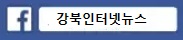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