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세요~ 함께 사는 세상이요~
세상도 천지도 갈수록 어수선합니다. 코로나19는 다시 기승이고, 날씨도 온갖 변덕을 부리는데, 일부지만 정신줄 놓은 듯한 사람들은 천지사방팔방으로 날뜁니다. 평화는 고사하고 안녕과 질서조차 난망인 듯합니다.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정보과잉 시대입니다. 정보가 지식으로, 지식이 지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퍼뮤니케이션(펌+커뮤니케이션), 즉 콘텐츠의 무한다단복제가 사이버 공간을 타고 바이러스처럼 자가증식을 하는 형국입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던 옛사람의 말이 새삼스럽군요.
결국 말이란 소통의 문제일 테고, 소통은 수용자의 자세에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겝니다. 그래서 '귀있는 자는 들어라'고도 했을까요. 사족이 사족을 낳고, 번쇄함이 스스로를 옭아매는군요. 하지만 이에 다시 또 뭘 덧붙여야 하는 게 또한 우리 사는 모습일진저. '이야기'라면 그나마 재미나 있을까 합니다.
하나.
미국에서의 얘기랍니다. 어떤 백인 엘리트 청년이 인디언 보호구역을 여행하게 됐답니다. 햇살은 밝고 대지는 넉넉했지요. 자연과 교감에 흠뻑 취한 청년은 생명의 대기를 마음껏 호흡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보았구요.
인디언 마을 입구였습니다. 한켠에서 초라한 난전을 펴고 있는 인디언 노인을 만납니다. 꾀죄죄한 행색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당함은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 담배 몇 가치, 청년으로서는 이름모를 약초 몇 뿌리에 기묘한 색감의 인디언 민속품 몇 점을 펼치고 있는 난전은 청년의 눈에는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겠지요.해는 한낮을 넘기고 있었고, 보아하니 그 같은 난전을 펼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듯한 노인은 아직 마수도 못한 낌새였습니다.
저런 물건들을 누가 살까. 언제쯤이면 물건을 다 팔고 노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동정어린 눈길로 노인을 바라보던 청년은 이윽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 모두 얼마냐고.
갑자기 나타난 청년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노인이 말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필요하냐고. 그리곤 더 결정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설사 청년에게 이게 다 필요하다고 해도 나는 다 팔 생각이 없노라고. 아직 해는 남았는데 지금 이걸 다 팔아 버리면 남은 시간은 뭘 하고 보낼꺼냐고.
둘.
옛 중국으로 가봅니다. 차치리(且置履)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해 자신의 발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한자로 그런 본을 탁(度)이라 한다지요. 그러나 막상 장에 가면서는 깜박 잊고 탁을 그냥 두고 갔습니다. 장에 이르러서야 탁을 집에 두고 온 걸 깨달은 차치리는 탁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장에 돌아왔을 때는 장은 이미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지요. "그냥 당신 발로 신을 신어 보지 그랬소."
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렴 발이 탁만큼 정확할려구요."
셋.
이번엔 멀리 중동으로 넘어가 봅니다. 대박의 꿈을 안고 대상(隊商) 길을 떠난 중년 상인이 일행에서 낙오돼 사막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물과 길을 찾아 헤매던 그에게 한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동쪽으로 한 시간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서 아주 소중한 보배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자는 말합니다.
과연 오아시스는 있었습니다. 상인이 오아시스에 이르자 그 샘물가에서 수행중이던 한 현자가 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어제 꿈에 예언자가 현몽하여 '어떤 상인이 나타나 소중한 보배를 찾으면 이 금덩어리를 주라'고 하더군요. "자, 가져가십시오."
횡재를 한 상인은 '이제야 내게 운이 트이나 보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금덩어리를 짐 속에 단단히 챙겨 넣고 내일 길을 떠나기 위해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왠지 속은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상인은 깨닫습니다. 현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찾던 소중한 보물은 이 금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를 선뜻 내 줄 수 있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코로나19에 물난리에 폭염까지 겹치며 경자년 올해도 다사다난합니다. 예년에 비해 더 가혹하기도 하구요.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도 난맥상은 치열합니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다 너 때문이야, 너는 뭘 잘했는데. 정처없이 떠도는 세상사에 뭇생명들의 비명이 절박합니다.
몸은 바쁘고 맘은 한가해야 좋은 삶이라 했습니다. 목하 우리 주변을 돌아볼라치면, 오히려 몸은 한가함만을 쫓고 맘은 갈피없이 바쁜 모양새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조선 중기 때 사람 신흠(申欽)은 옛사람의 글 속에서 맘에 와닿는 내용을 그때그때 메모해 둔 글을 남겼습니다.
차 익어 향기 맑을 제 길손이 찾아오니 이 아니 기쁠소냐.
새 울고 꽃이 질 땐 아무도 없다 해도 맘 절로 유유하다.
참근원(眞源)은 맛이 없고 진짜 좋은 물(眞水)은 향이 없네.
홍길동의 저자 허균(許筠)도 “한가한 사람 아니고선 한가함을 못 얻으니, 한가한 사람이란 등한히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지나치게 아찔한 삶을 경계합니다. 그런 허균의 책에 이런 애기가 나옵니다.
가난에 쪼들리던 선비가 밤마다 향을 피우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공중에서 한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너의 정성이 지극하니, 소원을 말해 보아라. 제가 바라는 건 아주 작습니다. 먹고 입는 게 조금만 넉넉해져서 산수 사이에서 유유자적하다 가는 것입니다. 공중의 소리가 크게 웃었다. 이는 하늘나라 신선의 즐거움이니 어찌 쉬 얻겠는가. 부귀를 구한다면 또 몰라도.
사실 고단한 삶 속에서 한가함을 얻기란 그리 쉽진 않겠지요. 남들은 다 달려가는데, 걸어서라도 따라가지 못하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자주 엄습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이라도 하늘을 보고, 또 조금은 더 느리게 살고, 천천히 음미하며, 새삼 사물을, 친구를 자세히 바라다보는 것 또한 잘 사는 삶이 아닐까요.
전인철 편집주간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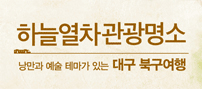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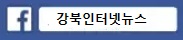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강북신문인터넷뉴스(주)인터넷신문등록 대구 아 00126등록일자 2013년 12월 18일발행인 김재우/편집인 김영욱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