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tow job)족’이란 취미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본업에 부업까지 병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신어(新語)이다. 김국화(읍내동, 49) 씨는 행사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안다는 사회자이자 웃음치료자이자 가수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5일, 관음동의 한 카페에서 MC 국화 씨를 만났다.

약 20년 전, 국화 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우울증이 온 줄도 모르고 힘든 나날을 보내던 국화 씨는 한계에 다다르자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웃음 치료를 권했다. 처음 국화 씨에게 웃음 치료 교실은 치료를 목적으로 억지로 가는 곳이었고, 즐겁지 않았다. 당시 웃음 치료 교실에서는 수업 내용 활용을 위한 실습을 진행했다. 그것이 국화 씨의 첫 웃음 치료 봉사 활동이었다. 국화 씨는 첫 봉사에서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웃음 치료 봉사를 다니다가 행사 진행 권유를 받게 되었고, 지금의 MC 국화가 생겨났다.
“사회자 생활을 한 지 16년이 되었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두통도 심했고,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다 가게 된 병원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보라고 했다.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나는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을 뿐인데도,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고 내가 우울한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또 내가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 대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뻔한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줄 수 있었다. 활동 영역도 넓혀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즐거웠다. 내가 즐거우니까 사람들도 즐거워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화 씨가 말하는 현장 MC란 ‘카멜레온’이다. 유쾌한 무대에서는 유쾌하게, 진중한 무대에서는 진중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엔 황수경 아나운서를 보고 모델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 진행자는 방송 진행자와는 다르다. 많은 MC분들이 ‘이 무대는 나의 무대’라고 착각을 한다. MC는 관객과 행사 주최자를 연결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상도 공연하는 사람들 보다는 튀지 않고 관객들 보다는 갖춰 입을 수 있도록 한다. 착각을 하면 무대가 원래 색깔과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관객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중계자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국화 씨는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일 때 잠실체육관에서 박 대통령의 후보자 연설의 사회를 맡았다. 한 출연자의 무대를 마치고, 다음 출연자를 소개하려는 순간, 진행 요원이 손으로 엑스를 그렸다. 다음 출연자가 준비가 덜 된 바람에 국화 씨가 대본도 없이 10분을 채워야 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무대 앞에는 박 대통령이 앉아서 국화 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국화 씨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대통령 후보자 연설은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이다. 그날은 초긴장을 했었다. 그 10분이 엄청 길게 느껴졌다. 현장 MC들은 모든 것이 생방송이다 보니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 그 당시 무슨 멘트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오늘 목적이 뭔가’, ‘이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라는 생각이 났다. 현수막을 보고 이 자리의 목적에 대한 말을 했다. 지금은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직업의 특성상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국화 씨. 국화 씨는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진행자이지만 가족에게는 ‘바쁜 엄마’이다. 국화 씨에게는 아들(20) 한 명과 딸(18) 한 명이 있다. 국화 씨는 성공한 사회자이지만 그만큼 엄마로서의 역할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는 친정집에 계속 맡겨 놓았고 밥도 잘 차려주지 못했다. 그러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과 74세인 친정어머니를 함께 행사장에 데리고 갔다.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매일 늦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우리 딸이 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무대에 같이 올라간 적도 있다. 직업 덕분에 아이들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늦게 귀가할 것 같다. 그런 점은 미안하기도 하다.”
지금의 직업을 갖기 전, 원래 그림을 그렸던 국화 씨는 다시 미술인으로 회귀할 꿈을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있다. 한때는 한국화를 전공하여 미술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다. 국화 씨가 붓을 놓은 지 어느덧 7년 정도가 되었다.
“지금 목표는 지금처럼 사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지부터 생각한다. 이런 일상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지만, 흰 머리가 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다시 붓을 잡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정은빈 기자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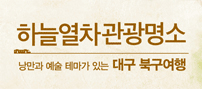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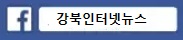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