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이편 1-6)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아, 집에서는 효성스럽게 하고, 나가서는 우애롭게 하거라. 행실은 삼가고, 말은 신실하게 하라.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하되, 인(仁)한 이를 가까이 하거라. 이 모든 걸 행하고도 남는 힘이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문자를 익혀라.”
(子曰, “弟子, 入則孝, 出則悌,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이 장은 두 글자가 핵심이다. 행(行)과 학(學)이다. 앎과 행위의 문제, 지식(이론)과 실천의 문제다. 차례대로 보자. 앞 부분은 논어 전체에서 자주 보게 되는 ‘좋은 삶을 위한 행동 지침’ 즉 덕목들이다. 이미 봤듯 효제(入則孝, 出則悌)가 그렇고, 삼가는 언행이 그렇고, 애친(汎愛衆, 而親仁)이 그렇다. 그런데 기실 이 장의 주안점은 이런 덕목들을 설교하고자 함이 아니라, 끝자락 ‘이런 덕목들을 다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거든, 그제야 지식을 추구하라’는 대목에 있다. 이 한마디를 하고자 앞의 교훈들이 등장했다.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앎과 행함의 문제’는 사람들의 근본 고민이었다. 특히 배운자, 지배층의 경우는 이 문제가 더 도드라진다. 보아하니 아는 건 많은 것 같고, 말도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 행실은 자신이 떠벌린 말을 못 쫓아가는 식자층.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전지전능인듯 제맘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지배자. 전자는 세상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들이고, 후자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 존재들이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우리 대부분이 그런 고민을 안고 산다. 알긴 알겠는데, 막상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일 말이다. 성인군자나 돼야 아는 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으려나. 그래서 성현들은 언행일치, 즉 지식과 실천의 불일치 문제를 무척 경계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말이나, 말부터 앞서는 사람 믿을 것 못된다는 말 따위가 그것이다.
말과 행실이 같아야지
언행일치, 지행합일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문제와 모르면서 겁도없이 저지르는 문제. 그러니 언행일치, 지행합일은 앎과 행함이 나란히 함께 가라는 말이겠다. 제대로 알고 나서 비로소 행하고, 역으로, 행함이 없는 앎은 죽은 앎이라는 걸 행함 중에 알고, 이 둘이 무한 교체 반복되는 일 말이다. 어렵지만 언행일치는 그것 뿐이다. 그 걸림돌부터 보자.
첫째, 알고도 행하지 않는 문제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당사자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으나, 원론적으로는 참된 앎은 행함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 원래 앎 또는 지식이라는 게 좋은 삶을 위해 계발되는 것이라, 좋은 삶을 위한 길을 알게 됐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건 그 길이 길 아닌 이유 말고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사람은 좋은 삶을 살고 싶어한다는 걸 전제하긴 하지만. 게으른 자는 좋은 삶에 그다지 관심없는 자다.) 암튼 오늘 본문은 앎보다는 함이 핵심임을 말한다. 앎과 행함의 순서를 말한 게 아니다. ‘남은 힘’을 강조하는 건 수사학일 뿐이다. 삶은 함이지 앎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 당시 식자층이 하도 앎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를 무척 경계한다. 죽은 지식. 공자 당대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문맹이었다. 피지배층은 고사하고, 지배층이라고 모두 식자층인 것도 아닐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모양을 갖춘 ‘인성 교육’을 처음 실시한 사람이 공자다. 그러니 문자를 익힌다는 건 대단한 특권이었다.(공자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호를 열었다.) 특히 사회적 성공을 이루려는 젊은이들은 공자 문하로 몰려 들었다.
“행하고도 남은 힘.” 이 말은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다. 먼저 삶에 충실한 인간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힘이 남거든 지식을 배우는 게 맞다. 그렇지 못한 지식은 자칫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지식이 될 수 있다.
모른다는 걸 아는 일
둘째, 잘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행하는 경우다. 이게 더 문제다. 사람은 뭐든 알고 싶어한다. 알지 못하는 것, 미지의 것은 두렵기 때문이다. 낯선 이가 그렇고, 좀비가 그렇고, 미래가 그렇고, 죽음이 그렇다.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앎이란 게 참 묘해서, 일단 뭘 좀 알게 되면 서푼어치라도 그걸 남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인간 본능이다.
(지식욕의 근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다. 문제점의 정체를 알아야 해결 방안도 찾아볼 수 있다. 진단을 해야 처방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알고자 하는 욕망을 더욱 발전시키는 쪽으로 진화한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욕망 자체를 진작시키다 보니 어느 결에 욕망 자체가 목적이 됐다. 생존 수단으로서의 앎이 목적이 돼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를 호기심이라 한다. 삶의 문제해결을 위한 앎과 호기심 충족을 위한 앎, 이 두 가지의 경계는 모호하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사람이 창의성이 많게 마련이고, 생존에 더 유리하다. 너무 지나친 호기심은 오히려 생명 자체를 위험하게 하기도 하지만.)
속이거나 지배하거나
아는 걸 세상에 말하고 싶은 본능, 이 본능은 자칫 세상을 내가 아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으로 연결된다.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그건 곧 지배욕으로 이어진다. 처음에는 선의였을지라도 결국은 타인을 억압하거나 가스라이팅 한다. 꼭 잘난 체, 아는 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 선의를 보상받을 것 같아 그러기도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상대방이 보기에는 이게 별로일 경우가 많다는 거다.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제 행실은 돌아보니 않고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 하고, 이끌려 하고, 다그친다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너나 잘 하세요’하기 마련이다.
논어는 자주 말한다. 덕행없는 덕목이 뭔 소용이냐고. 알지도 못하고 떠벌려,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되레 삶을 망치는 앎. 고담준론으로 폼잡지 말라고. 그만큼 공자는 언행일치에 무게를 둔다. 말의 진정성은 행동이 증명한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결과가 증명한다. 아니면 그 말이 삶에 무슨 덕이나 득이 되겠느냐고. 이런 견지에서 공자는 현실주의자고, (좋은 의미의) 세속주의자고, 실천가이며, 대지의 삶을 긍정한 사람이다. 이상(理想)을 추구하되 그 이상은 어디까지나 ‘좋은 현실’을 위한 이상일 따름이다. 그래서 공자는 허무맹랑한 말, 실제 행실과 동떨어진 말을 매우 싫어했다. 특히 지식인 지도자 리더 따위가 그러는 경우는 치를 떨며 응징하려 했다.
얼치기 앎은 위험하다
앎이란 게 이처럼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 조심해 다뤄야 한다. 공자는 둘로 이를 경계했다. 하나는 겸손이요, 둘은 유연함이다. 내가 아는 게 맞는 걸까. 세상에 도움이 될까. 아니 어쩌면 내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때는 맞았더라도 지금도 맞을까. 그러니 함부로 떠벌리는 일은 경계해야지.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어. 스스로 늘 조심하고 재검토하고 자기성찰도 해야지.
논어 첫 편인 이 ‘학이편’은 공자학단의 강령이다. 인(仁)을 가르쳐 세상을 바꿔보려는 공자 사상의 대강이 잡혀 있다. 인을 구현하는 수단의 요체는 학(學)이다. 공자는 스스로를 호학(好學, 배우기를 좋아함)하는 사람이라 내세웠다. 다만, 배움이 머릿속 배움으로만 그친다거나, 제 아는 게 전부인양 자만을 부린다거나 하는 배움은 아니배움만 못하다. 왜 배우는지, 무엇을 위해 배우는지를 놓치면 그 뒷탈이 심히 두렵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위 ‘배운자’들의 헛발질에 멍들고 있다. 그렇다고 ‘반지성주의’가 답도 아니니, 황망할 따름이다.
전인철 편집주간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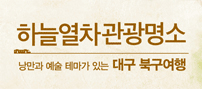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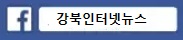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강북신문인터넷뉴스(주)인터넷신문등록 대구 아 00126등록일자 2013년 12월 18일발행인 김재우/편집인 김영욱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