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이편 1-7) 자하가 말했다. “현명한 사람을 현인으로 대하기를 아리따운 여인을 좋아하듯 하라. 부모를 섬기되 힘을 다 할 수 있고, 임금을 섬기되 몸을 다 바칠 수 있고, 친구와 사귀되 말과 행동이 같을 수 있다면, 비록 그가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 일컬을 것이다.”(子夏曰 “賢賢易色, 事父母, 能竭其力, 事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
논어는 입만 열면 임금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잔소리’를 하니, 이제 그 충효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따분하기만 할 수 있다. 하기야 공자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2천 5백 년 전, 지금의 우리와는 천양지차가 있는 세상을 산 사람이니, 그 생각이나 가르침이 요새 같은 복잡다단한 세상,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별로 와 닫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그 정신이나 마음이나 얼 같은 건 새삼 새겨들을 것도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는 게 있고, 세월이 흘러도 안 바뀌는 게 있으니 말이다. 안 바뀌는 그게 사실 고전의 알갱인데, 암튼 이런 취지에서 오늘 구절을 좀 넉넉하게 한 번 풀어보자.
사람의 값어치
“독살이가 아닌 모듬살이를 하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삶이란 인간관계의 연속이다. 살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서로에게 큰 복이다. 그러니, 살다가 ‘어, 저 사람 참 괜찮네’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여 가릴 것 없이) 젊은 날 멋진 이성을 만나 첫 눈에 반했을 때, 구애를 하는 심정이나 그런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라. 사랑을 하면 착해진다 했던가. 잘 해주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말도 통하고, 서로가 믿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픈 마음 말이다. 세상 사람들 상당수가 상대와 연애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좋은 세상, 좋은 삶이 이뤄지지 않겠나.(그럴려면 첫눈에 반해야 하는데, 그게 참.)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그 대표가 부모님)의 은혜는 잊지 않고, 자신을 좋은 길로 이끌어 준 사람(군사부 일체, 즉 인생의 스승이나 멘토나 좋은 선배)을 존경하며, 비슷한 인생여정을 밟아 가는 친구에게는 의리있다 소리를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가방끈 짧고, 가진 것 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 그를 ‘찌질이’라 매도할 수 있으리오.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물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꿈같은 말씀
참 꿈 같은 소리다. 요새 세상에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설사 대오각성 하여 그런 것과 비슷한 사람이 되려 애쓴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팍팍할 것이다. 늘 당하고 밀리고 손해보기 십상이다. 대개는 그런 사람이 될 자신도 없지만 되고 싶지도 않다. 그런 순진한 사람은 도태되고 만다. 내가 왜 그런 험로를.
청춘남여 사이에도 그렇다. 한창 연애할 땐 과잉 분비되는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 간 쓸개 다 빼줄듯,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듯 하지만, 한바탕 열정의 쓰나미가 지나고 나면 서로 잇속 챙기느라 바빠. 결혼하고는 상대가 변했다고들 하지만 어쩌면 결혼하고는 본모습으로 돌아온 건지도 모른다. 그래도 심장 한 켠에는 아련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남아 있겠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나. (젠더 갈등이 왜 생겼나. 모든 게 너 때문이야.)
공자님 말씀이 뭐라고 한들 잘 살려면 내가 먼저고, 내 새끼가 먼저고, 내 집이 먼저다. 아니, ‘먼저’가 아니라 ‘뿐’이다. 사랑타령하는 놈들 봐라. 어찌 살고 있는지. 무능한 새끼들이 노력도 안하고 퍼 자빠져 놀다가 살기가 어려워지니 자기합리화나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은 대개 착하다
뭐, 이 정도까지 비관적으로 그릴 건 없다. 그러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염량세태’를 경계는 해야 한다. 왜. 모두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서다. 당장 돈 된다고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역사가 가르치는 현명함이다.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대부분 착하다. 옆사람 생각도 하고, 왠만하면 양보도 할 줄 알고, 친절 배려까지는 몰라도 불쌍한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을 보면 동정이나 공감이라도 한다. 간혹 겉으로 보기에 모질고 독하다 싶은 일을 저지르더라도, 금방 반성하고 제자리를 찾는다. 미안해 하고 자책한다. 세파에 찌들리기는 가진자 배운자 높은사람들보다 더 한 데도 말이다.
원래 사람이 좀 착하다. 도덕감정은 인간 본능이다. 생존경쟁을 하지만 생존협동도 한다. 인류문명은 협동의 산물이다. 경쟁에 지나치게 쏠린 문명은 이미 망하고 없지 않은가.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는가. 사람이 착하다는 말은 먼저 나쁜 짓을 잘 하진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당하면 갚아준다. 관계를 손절한다. 그것도 못하면 멍청이다.) 암튼 그러니 일상을 사는 보통의 생활인들은 대개 착하다. 나쁜 짓하면 결국 내 손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감정이라는 본능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번창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부분 착한 사람들아 모여 사는 세상은 왜 그렇게 모순과 비리와 악행이 횡행하나.
기득권을 영원히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흐린다. 흔히 지배층 지배계급 상류층 등으로 일컬어지는 기득권층이다. 말 그대로 ‘이미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의 힘 즉 능력으로 세상이 이만큼 만들어졌고, 이렇게 굴러간다. 공적이 크다. 능력도 고마워할만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일단 동서고금 모든 기득권은 주인행세 하기에 바빠, 변화를 두려워한다. 이대로 쭉 가자. 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늘 변하고 있으니,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도태된다. 세상 이치다. 기득권은 이에 극렬 저항한다. 이미 자기들이 구축한 강고한 사회시스템을 십분 활용한다. 정계, 재계, 학계, 관료, 법조, 언론 모두 ‘카르텔’로 작동한다. 심지어 피지배계급마저 이들에 포획된다. 을이 갑의 행동대장이 된다. 그러나 모든 힘은 세면 셀수록 부패 타락한다. 그러니 사회 진화는 지연될 수 밖에. (물론 급변해도 세상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보수와 진보의 수위조절은 인류사회의 영원한 난제다. 오해는 마시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사수하려는 그 계급의지를 지칭하는 거다. 그 누구든 힘을 얻게 된 자는 그 힘을 마구잡이 부린다.)
공자에게 정의란
공자가 요새 세상에 온다면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보수라 할까, 진보라 할까. 공자의 정치사상은 한마디로 ‘정의(正義)로 다스린다’이다. 이념이 아니라, 원칙으로 통치한다는 말이다. 공자는 교조적 정치 이념을 극혐했다. 삶이 이념에 끌려다녀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형국이니 기형이라 했다. 그는 군주든 벼슬아치든 일반 백성이든 정의에 어긋나면 비판하고 심판한다. 그런 공자에게 정의란 ‘배움과 능력에 기반한 통치체제’였다. ‘배움’은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잡고, ‘능력’은 세상이 그렇게 나아갈 동력을 제공한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배움은 브레이크나 핸들(스티어링 휠)이고, 능력은 엔진이다. 엔진만 좋은 차는 달리면 신이야 나지만 언젠가는 어디에 부딪힌디. 망한다.
요새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엔진 마력에만 꽂힌다. 삐까뻔쩍 한 자통차 외양에만 쏠린다. 내 차를 꿈도 못 꾸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서러워서, 고생 끝에 마련한 자가용이 너무 멋져 보여 흥분되는 건 이해하지만, 이제 내 차도 생겼으니, 이 차 타고 어디를 갈 것인지, 안전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좀 생각할 때다. 페라리 아우디 벤츠면 뭐 하나. 담벼락에 처박히면 똥차인 것을.
전인철 편집주간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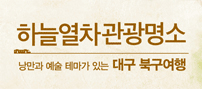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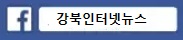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강북신문인터넷뉴스(주)인터넷신문등록 대구 아 00126등록일자 2013년 12월 18일발행인 김재우/편집인 김영욱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