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으로 지어진 예배당 부속건물의 토담집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다. 외풍이 심해 겨울엔 귀가 동상에 걸렸다가 봄이 되면 낫곤 했다. 그래도 그 조그만 방은 글을 쓸 수 있고 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창호지 문에 빗발이 쳐서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으로 개구리들이 뛰어 들어와 꽥꽥 울었다.
겨울이면 아랫목에 생쥐들이 와서 이불 속에 들어와 잤다. 자다 보면 발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옷 속으로 비집고 겨드랑이까지 파고들기도 했다. 처음 몇 번은 놀라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지내다보니 그것들과 정이 들어버려 아예 발치에다 먹을 것을 놓아두고 기다렸다.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굼벵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도 슬픔도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황금 덩이보다 강아지 똥이 더 귀한 것을 알았고 외롭지 않게 되었다.”
권정생 선생이 1967년부터 1982년까지 살았던 시골교회의 문간방 생활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동화작가 권정생
스스로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강아지 똥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권정생은 1937년 9월 10일 일본 도쿄의 혼마치에서 태어났다. 정생네 가족은 헌 옷 장사를 하는 일본인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었다. 정생의 아버지는 청소를 하고 어머니는 삯바느질을 했다. 그래도 하루에 세 끼 다 챙겨 먹는 날이 드물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정생은 늘 형들의 옷을 물려 입어야 했고, 동화책도 얼룩지고 너덜너덜해진 것을 몇 번이고 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청소부 일을 하는 아버지가 헌책을 가져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표지를 한 번 더 씌우는 것이었다.
헌 동화책은 정생에게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그것을 통해 글자를 익히고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었다.
형과 누나들이 있었지만 어린 정생에게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지는 못했다.
분뇨를 수거하다가 청소부로 일자리를 바꾼 아버지를 따라 형들도 아침 일찍이 집을 나서야 했다. 쉬는 날도 없이 작업복 바지를 입고 무릎까지 오는 각반을 감은 채 일터로 나갔다. 언젠가 셋째 형이 한동안 집에서 누워 지낸 적이 있었다. 유난히 얼굴이 하얗고 목이 길던 셋째 형은 찹쌀종이에 싼 흰가루(학질에 쓰이는 염산키니네)를 힘없이 받아먹었다. 형의 얼굴은 열꽃이 번져 온통 붉게 변해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찬 물수건으로 형의 몸을 연신 닦아 주었다. 늘 병을 달고 살던 셋째 형이었지만 정생은 ‘꼬마언니’라 부르며 잘 따르고 좋아했다.
큰누나도 아침이면 공장으로 출근했다. 큰누나는 열두 살 때부터 열네 살이라고 속이고 사탕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챙겨들고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없이 뛰어나가던 누나의 모습을 정생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정생네 집에서 작은누나만이 유일하게 소학교(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작은누나마저 책보를 메고 학교에 가면 집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세 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지만 너무 어려서 어울려 놀기는커녕 이것저것 챙겨줘야 하는 것이 일이었다.
부모를 잃은 경순이 누나
그 시절에 정생은 골목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마냥 반가웠다. 골목길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 그중에서 정생의 손을 잡고 가끔 극장에 데려가 주던 옆집 누나 히데코는 항상 말이 없고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씨로 언제나 정겹고 친절하게 정생을 대해주었다.
골목에서 자주 마주쳤던 또 한 사람이 10여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923년 관동대지진 때 부모를 잃은 경순이었다. 스무 살쯤 된 경순은 정신이 온전치 않아 자기 나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넋이 나갔기 때문이다.
졸지에 고아가 된 경순은 여기저기 떠돌며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면 찬거리를 사려고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생은 반갑게 달려가 시장까지 나란히 걸어가기도 했다.
경순은 이따금 주인집 여자에게 얻어맞아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정생의 집으로 달려와 숨을 때가 있었다. 그릇을 깨뜨리거나 청소를 하지 않아서 맞았다는 것이다. 어떤 날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다.
정생의 어머니는 경순이 애처롭다며 잘 숨겨주었고, 간혹 밥을 먹이거나 잠을 재워주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정생은 경순이 누나가 불쌍해서 자꾸만 눈물이 났다.
정생의 마음속에 평생 잊히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
목생은 정생의 둘째 형이었다. 그러나 둘째 형을 본 적이 없었다. 정생의 아버지는 부쳐 먹을 땅이 없어 돈을 벌려고 일본에 갔다. 어느 날부터 간혹 오던 편지가 끊어지자 정생의 어머니는 남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넜다. 그때는 정생이 태어나기 일 년 전이었다. 당시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다섯 명 있었다. 어머니는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찾아다니며 수속을 밟았는데 일본에 갈 수 있는 인원은 네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열아홉 살이었던 첫째 형은 만주로 갔다가 나중에 일본에서 만나기로 했다. 열다섯 살의 둘째 형 목생은 경상도 산속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외갓집에 맡겨졌다. 당시 목생의 외할머니는 문둥병(한센병)에 걸린 막내 삼촌을 데리고 산에 숨어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의 형편은 몹시 어려워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었다.
나무를 좋아했다는 목생이 형은 결국 굶어 죽었다. 사람들을 피해 산속 깊이 숨어 살던 할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쌀을 살 돈이 없었다. 목생이 형은 산을 뒤지며 산나물과 칡을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겼다. 너무 배가 고프면 싸리나무로 덫을 만들어 쥐를 잡아먹었다. 그런 가난을 버텨내다가 목생은 2년 후 굶어 죽고 만 것이다. 정생은 돌도 지나기 전의 일이었다.
정생도 혼마치의 빈민가 뒷골목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자라났다. 어느덧 소학교에 입학하게 된 정생은 무엇보다도 교실에 동화책이 많아서 좋았다. 그 덕분에 마치 날개라도 단 것처럼 즐겁게 학교에 다니며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었다. 일찍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정생은 공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고 책 많이 읽는 아이로 통했다.
정생의 눈물을 닦아준 히데코 누나
1944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도쿄 상공에 미군의 B29 폭격기가 나타났다. 미군의 폭격으로 도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혼마치 뒷골목도 폭격을 맞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정생네 가족이 방공호로 대피했다가 돌아와 보니 집 안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의 한쪽만 폭격에 맞았는데 커다랗게 구멍이 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 정생의 가족은 결국 살길을 찾아 시골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사하는 곳으로 떠나는 날에 정생은 가방에서 동화책 몇 권을 꺼내 경순을 찾아갔다. 정생은 동화책들을 경순의 품에 안겨주고 어머니 손에 끌려 정든 골목을 떠났다. 경순은 머뭇거리며 정생네 식구를 따라왔다. 정생은 그 모습을 보며 경순이가 매를 맞아도 이젠 숨을 곳이 없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경순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정생은 차마 경순 누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다. 걷는 자리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마른 땅을 적셨다.
그다음에 정생은 히데코의 집으로 갔다. 히데코는 평소와 다르게 침울한 목소리로 자신의 가족도 내일 이곳을 떠난다고 말했다. 히데코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는 정생을 안아주었다. 어디를 가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히데코의 목소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생이 히데코의 품에서 벗어나며 슬쩍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히데코 누나가 울고 있었다. 정생은 들고 있던 동화책 한 권을 히데코에게 내밀었다. 히데코가 “나는 줄 것이 없는데…….”라고 말하자 정생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히데코가 정생에게 소학교 입학을 축하한다며 준 선물이었다. 손수건에서 히데코 누나의 향기가 났다. 그동안 책가방에 넣어두고 있어서 미처 향기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손수건을 보여주며 정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히데코는 그 손수건으로 정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중에 아주 많이 슬프고 아플 때 실컷 울고 지금은 참으라고……. 그리고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라고 말했지만 정생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 훌쩍이며 한자리에 서 있자 히데코는 화가 난 사람처럼 몸을 돌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생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키도 작고 손도 조그만 히데코 누나의 향기를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지인호 사회문화평론가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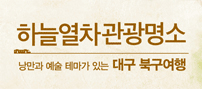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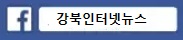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