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세요~ 함께사는 세상이요~
돌고래는 포유동물로 허파 호흡을 한다. 아가미호흡이 아니니 물 속에 오래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물 밖에 오래 있어서도 곤란하다. 연약한 피부가 말라, 갈라지기 때문이다. 물 속과 물 밖을 오가며 그때그때 삶을 잘 영위해야 한다. 어느 한 곳이 당장 좋다고 너무 오래 머물러서도 안 된다. 물 안팎의 경계에서 늘 생명의 한결같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를 많이 써야 한다. 동양철학에서는 이를 시중(時中)이라 하는데, 시중을 잘 하면서 사는 동물인 돌고래는 그래서 동물 가운데 성인(聖人)이다.
물 안팎을 늘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 그 어디서든 깊은 잠을 잘 수는 없을 것이다. 곯아 떨어졌다가는 목숨이 위험하다. 그래서 돌고래는 기발한 생존 메카니즘을 만들었다. 깨어 있는 채로 잠을 자는 방법이다.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가 번갈아 자는 것이다. 왼쪽 뇌가 자면 오른쪽 뇌가 활동하고, 그 반대로도 작동한다. 그러니까 돌고래는 놀이공원에서 재주를 부릴 때라도 반은 자고 있는 셈이다. 돌고래 뿐만 아니라 물범, 물개, 매너티 등 바다 포유류는 대개 그렇단다. 먼거라를 날아가는 철새도 그렇고. 이렇게 뇌가 교대로 자다 깼다 한다니 참 부럽다.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보면 늘 깨어 있으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하는데, 돌고래는 자동으로 오매(寤寐)가 하나니 큰 맘고생이 없다는 말 아닌가.
암튼 돌고래는 좌우 뇌 반구의 기능 교대를 면밀히 하고자, 작은 신경기관을 추가로 만들었다. 제3의 뇌라 부를 만하다.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제3의 눈과 비슷하다.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최고 신전을 델포이라 불렀다. 돌고래를 뜻하는 그리스어 델피스에서 나온 말이다. 유래는 이렇다.
제우스는 세계의 중심이 어딘지 궁금했다. 그래서 지구 양 끝에서 독수리 두 마리를 날려 보냈다. 두 마리가 만나는 곳이 중심이지 않겠는가. 두 독수리는 그리스 중부 파르나소스 산 중턱의 한 동굴에서 만났다. 옴파로스. 세상의 배꼽이었다.
이 동굴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명을 받은 거대한 뱀이 지키고 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은 이 뱀을 죽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신전을 세운다. 이제 신전을 지킬 사제를 들여야 한다. 두루 세상을 살피던 아폴론의 눈에 마침 배를 몰고 가는 크레타 사람들이 들어왔다. 아폴론은 돌고래로 변하여 그들을 신전 쪽으로 이끌었다. 돌고래를 따라 왔다 하여 신전 이름이 델포이가 되었다. 아폴론은 왜 돌고래로 변신했을까. 돌고래가 어디서나 매혹적이긴 하다. 깨어서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 있으니, 어찌 아니 그렇겠는가. 장자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려 그리 애를 썼는데, 사실 돌고래가 장자보다 낫다.
돌고래는 어디로 갔을까
꿈과 현실의 사이를 멋지게 유영하는 델포이 신전은 영험한 신탁으로 첫 손가락이다. 신전 입구에는 세 격언이 새겨 있었다 한다. 첫째, 너 자신을 알라. 둘째, 무엇이든 정도가 지나치면 안된다. 셋째, 서약에는 화가 따르기 쉽다. 첫째 격언은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고, 자신의 모토로 삼았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델포이 신전이 아폴론을 싫어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의 명령으로 문을 닫는다. 4세기 일이니, 그래도 천 년을 버틴 셈이다. 마지막 신탁은 이러하다. ‘아름다운 건물에는 작은 방도, 앞일을 말해주는 월계수도 남아 있지 않게 되리라. 샘물은 조용해지고, 말하던 물결은 침묵하리라.’
그렇다면 이제 델포이의 돌고래는 어디로 갔을까. 아마존 강에는 분홍 돌고래가 산다는데, 그가 그일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다.
극단은 모두 이단
신경, 골격과 함께 우리 몸의 운동기능을 감당하는 근육에는 수의근(隨意筋)과 불수의근(不隨意筋)이 있다. 한자 뜻풀이 그대로 수의근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고, 불수의근은 그렇지 못한 근육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팔 근육은 수의근이다. 우리가 팔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팔을 들 수 있다. 다리나 등에 있는 근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같은 한 몸에 있지만 심장 근육이나 내장 근육의 대부분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 내가 지금 잠시 심장을 멈추고 싶다고 해서 그리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심장근육은 자신이 제 시스템대로 알아 움직이는 불수의근이다. 불수의근은 자율신경의 지시를 받는다. 우리 근육이 골격근인 수의근과 내장근인 불수의근으로 나뉘는 건 생명의 소중함을 원초적으로 지키기 위한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델포이 신탁도 그랬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좋다고.
수의심 불수의심
그런데 이처럼 우리 몸에 수의근 불수의근이 있듯, 우리 마음에도 수의심(隨意心) 불수의심(不隨意心)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맘먹은대로 움직이는 마음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맘대로 작동하는 마음 말이다. 우리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내일이 시험날인데, 오늘 이리 놀아서는 안되는데, 알면서도 책상 앞을 떠나고야 마는 마음. 저 이를 더 이상 미워해서는 안되는데, 그래봤자 아무에게도 도움될 게 없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저 치가 미워 죽겠다 싶은 마음. 불수의심에 부대끼는 게 삶이다.
곰곰히 살펴보면 수의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식의 영역에서 발동된 마음이요, 불수의심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발동된 마음이 아닌가 싶다.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도 있지만, 의식이 이성과 자기극복 의지의 자리라면, 무의식은 본능과 욕망의 자리일 게다. 물론 의식은 거의 늘 무의식에 지지만 말이다.
흔히들 지적하듯 의식은 마음이라는 빙산의 극히 일부요, 물 밑 잠수 부분인 무의식의 세계는 그야말로 광대무변이라고들 한다. 무의식 영역이 넓고 깊은 만큼 인간의 마음과 이에 따른 행동을 지배하는 곳은 상당 부분 무의식일 게다. 인간은 이성에 따라 판단 행동하는 경우보다는 욕망을 따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말이다. 즉 '해야할 일 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인간 본면목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하고픈 일' 보다는 '해야할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니, 여기서 삶의 질곡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호흡근의 기적
이 대목에서 잠깐. 내가 하고픈 일과 내가 해야할 일이 자동적으로 일치되는 삶은 불가능할까. 몸과 맘이 하나로 이어지는 삶 말이다. 그런 삶이 당장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삶을 지향하는 자세만이라도 밝혀볼 순 없을까.
우리 몸 근육을 다시 한 번 보자. 앞서 얘기한대로 우리 근육은 수의근 불수의근이 엄연히 구분되는데, 다만 숨 쉬는 데 작동하는 호흡근은 두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호흡근이라는 별도의 개별 근육이 있는 게 아니다. 횡경막, 복근 등 호흡에 동원되는 모든 근육들을 통칭해 호흡근이라 한다. 이들 호흡근들의 유기적 구성을 통해 호흡은 수행된다). 즉 보통 때는 숨 쉬는 일을 의식하고 하진 않지만, 때로는 맘만 먹으면 숨을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다는 애기다. 물론 끝내 스스로의 의지로 숨을 안 쉴 순 없다. 아무리 숨을 참으려 해도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냥 숨이 터져 나온다. 아니라면 누가 자살할 때 목을 굳이 매겠는가. 결론적으로 호흡근은 수의면서 동시에 불수의라는 얘기다.
숨이라도 천천히
우리가 팔을 드는 동작은, '팔을 들라'는 두뇌의 지시가 전기신호로 근육을 수축시켜야 팔이 들리는 것인데, '팔을 든다'는 생각이 어느 시점에서 전기신호로 바뀌는 지는 현대 심신의학에서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한다. 즉 심신의학의 핵심과제인 심신 연결 기제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지혜는 객관적인 기제 규명은 아니지만 임상적 결과는 갖고 있다. 즉 옛부터 몸과 맘을 하나로 잇는 통로로 호흡을 강조해 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적 수행의 기초는 호흡에 있다. 긴장하면 숨이 가빠지고 자연 삶이 흐트려지는 것도 자율신경이 호흡조절의 균형을 잃기 때문이다. 그 균형을 되찾고자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게 수행의 기초다. 호흡근이 수의와 불수의 이중성을 갖는 건 호흡이 몸과 맘을 하나로 잇는 길임을 자연이 암시한 것 아닐까.
숨도 못쉴 것 같은 세상일수록 의식으로 깨어 숨이나마 제대로 쉬어 보는 그런 지혜는 어떻게 지닐 수 있을까. 숨이라도 천천히 쉬면 가능할까. 그렇지만 빨리빨리 헉헉거리면서 살아도 살똥말똥인데. 잠깐, 돌고래는 물 속을 제집처럼 드나들면서도 허파호흡을 한다는데, 그래서 돌고래가 지혜로운 걸까.
전인철 편집주간

-
이시간 최신뉴스
 새로고침
새로고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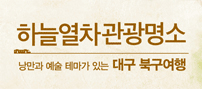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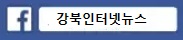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75길 6-4(태전동 961-10번지) 1층Tel) 053-312-4568Fax) 053-423-6678Mail) kbinews@naver.com Copyright 2014 KBINEWS.COM All Right Reserved.

.gif)















